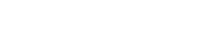-
Manage No, Sortation, Country, Writer ,Date, Copyright Manage No EE00000163 Country Republic of Korea ICH Domain Performing Arts Social practices, rituals,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about nature and the universe Traditional craft skills Address 궁중 무용인 처용무는 예술 공연을 위해 마련된 무대에서 공연되었으므로, 특정 지역이나 지리적 연고는 없다. 그럼에도 굳이 지리적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면, 고궁이 있는 대한민국의 서울(옛 이름은 “한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Year of Designation 1971.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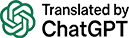
| Description | [처용무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처용무란 동서남북과 중앙의 5방에서 5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는 궁중 무용을 일컫는다. 때문에 ‘오방처용무(五方處容舞)’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의 궁중 무용으로는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탈을 쓰고 춤을 춘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1971년 1월 8일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된 처용무는 남자 무용수들이 연행(演行)하는 장엄하면서도 신비로운 춤이다. 통일신라 말기(B.C. 57년~A.D. 935년), 헌강왕(憲康王)이 행차하여 한반도 남동쪽 울산시 인근 개운포(開雲浦, 오늘날의 황성동 세죽마을)에 이르렀다. 왕이 환궁 차비를 하였을 때 짙은 운무(雲霧)가 낀 하늘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좌우에 그 이유를 물으니, 일관(日官)이 “이는 동해(東海)의 용(龍)이 부리는 조화이니,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여 이를 풀어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왕이 근처에 용을 위한 절을 짓게 하자, 먹구름이 걷히고 동해 위로 용이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솟아올라 춤을 추었다. 그 중 ‘처용(處容)’이라는 이름의 한 아들이 헌강왕을 따라 수도인 경주로 와서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관직을 얻어 머물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처용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역신이 그의 아내를 범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처용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자 역신이 모습을 나타내어 무릎을 꿇고 앉아 사과하였다. 이때부터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대문에 붙여 악귀를 몰아내고 상서로운 기운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고려 왕조 후기(918년~1392년)까지 처용무는 무용수 1인이 공연하였으나, 조선 왕조 세종(재위 1418년~1450년) 때에 이르러 무용수 5명이 춤을 추게 되었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따르면 음력 섣달그믐날, 묵은해의 역신과 사귀를 쫓기 위해 행하는 나례 의식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처용무를 추었다고 한다. 5명의 무용수는 각각 서쪽·동쪽·북쪽·남쪽·중앙의 오방(五方)을 상징하는 흰색·파란색·검은색·붉은색·노란색의 의상을 입었다. 처용무에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근거하여 악운을 쫓는 의미가 담겨 있어 장엄하고 활기찬 춤사위에서 씩씩하고 호방한 기운을 엿볼 수 있다. 처용무는 수제천(壽齊天, ‘하늘만큼 영원한 생명’) 음악에 맞추어 왕을 향해 나아가 “신라성대소성대(新羅盛代昭盛代, ‘밝고 번성한 시대, 신라’)”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처용가〉의 첫 수를 ‘언락(言樂)’이라는 서정적인 가락에 맞추어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무용수들은 왕을 향해 인사하고 향당교주(鄕唐交奏,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번갈아 연주)에 맞추어 무대 중앙으로 나아간다. 세영산(細靈山)의 느린 가락에 맞추어 무용수들은 정방형을 이루며 산작화무(散作花舞, ‘꽃의 형태로 흩어짐’)를 춘 후 오른쪽으로 돈다. 십자형으로 대열이 바뀌면 음악도 삼현도드리(3개 현악기로 연주하는 느린 6/4 박자 음악)로 변경된다. 수양수무(垂揚手舞, ‘팔을 들어 올려 흔들며 추는 춤’)와 무릎디피무(‘무릎을 움직여 방향을 바꾸는 춤’)을 마친 후 5인의 무용수는 대열을 원형으로 바꾸고 왼쪽으로 돈다. 다시 한 번 일렬로 대열을 바꾸고 나서 무용수들은 ‘산하천리국(山河千里國, ‘머나먼 산 또는 평야로’)’으로 시작하는 〈처용가〉를 다시 가곡 우편(羽編) 가락에 맞추어 부른 후 송구여지곡(頌九如之曲, 도드리의 일종)에 맞추어 낙화유수(落花流水, ‘떨어지는 꽃잎과 흐르는 물’)를 추며 무대에서 퇴장한다. 처용 탈은 팥죽색 피부에 치아가 하얗고, 납 구슬을 단 주석 귀고리가 달려 있다. 검은색 사모에는 모란 2송이와 복숭아 열매 7개를 꽂아 장식한다. 팥죽색과 복숭아 열매는 벽사(辟邪, 잡귀를 물리침)를, 하얀 모란은 진경(進慶, 기뻐할만한 일로 나아감)을 상징한다. |
|---|---|
|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 한국의 궁중 무용 중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처용무는 1971년 1월 8일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었다. 남자 무용수들이 연행(演行)하는 장엄하면서도 신비로운 춤이다. 고려 왕조 후기(918년~1392년)까지 처용무는 무용수 1인이 공연하였으나, 조선 왕조 세종(재위 1418년~1450년) 때에 이르러 무용수 5명이 춤을 추게 되었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따르면 음력 섣달그믐날, 묵은해의 역신과 사귀를 쫓기 위해 행하는 나례 의식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처용무를 추었다고 한다. 5명의 무용수는 각각 서쪽·동쪽·북쪽·남쪽·중앙의 오방(五方)을 상징하는 흰색·파란색·검은색·붉은색·노란색의 의상을 입었다. 처용무에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근거하여 악운을 쫓는 의미가 담겨 있어 장엄하고 활기찬 춤사위에서 씩씩하고 호방한 기운을 엿볼 수 있다. 통일신라 말기(B.C. 57년~A.D. 935년), 헌강왕(憲康王)이 행차하여 한반도 남동쪽 울산시 인근 개운포(開雲浦, 오늘날의 황성동 세죽마을)에 이르렀다. 왕이 환궁 차비를 하였을 때 짙은 운무(雲霧)가 낀 하늘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좌우에 그 이유를 물으니, 일관(日官)이 “이는 동해(東海)의 용(龍)이 부리는 조화이니,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여 이를 풀어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왕이 근처에 용을 위한 절을 짓게 하자, 먹구름이 걷히고 동해 위로 용이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솟아올라 춤을 추었다. 그 중 ‘처용(處容)’이라는 이름의 한 아들이 헌강왕을 따라 수도인 경주로 와서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관직을 얻어 머물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처용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역신이 그의 아내를 범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처용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자 역신이 모습을 나타내어 무릎을 꿇고 앉아 사과하였다. 이때부터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대문에 붙여 악귀를 몰아내고 상서로운 기운을 맞아 들이게 되었다. 처용무(處容舞)는 궁중 무용의 하나로서 오늘날에는 무대에서 공연하지만, 본디 궁중 연례(宴禮)에서 악귀를 몰아내고 평온을 기원하거나 음력 섣달그믐날 악귀를 쫓는 의식인 나례(儺禮)에서 복을 구하며(求福) 춘 춤이었다. 처용무를 통해 역병을 쫒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의미와 함께 오행설(五行說)로 대표되는 유교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처용무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한민국 정부는 1971년 1월 8일 처용무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처용무는 동서남북과 중앙 등의 오방(五方)을 상징하는 흰색·파란색·검은색·붉은색·노란색의 오색 의상을 입은 5명의 무용수가 오방에서 춤을 추는 궁중 무용이기에 정부는 국립국악원(前 이왕직 아악부, 조선 궁중음악단)단원 중 5명을 처용무 전승자로 지명했다. 2007년 8월 18일 김천흥 보유자가 타계한 뒤, 그해에 다른 보유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
| Transmission method | 기록에 따르면 독특한 가면과 복장을 갖춘 처용무는 악귀를 쫒아내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했었다. 즉, 고려와 조선 시대때, 처용무와 처용가(처용무와 노래)는 악귀를 몰아내고 평온을 기원하거나 음력 섣달그믐날 악귀를 쫓는 의식인 나례(儺禮)에서 복을 구하며(求福) 춘 춤이었다. 하지만 전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편견, 현재의 서구화된 종교적 관점 등의 이유로 오늘날 처용무의 주술적인 기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근대화로 인해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처용무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는 인간의 기원과 인류를 구현한 악기를 잃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경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인간의 정신 문화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 |
| Community | 처용무 보존회/ 국립국악원 기술보유자: 김용, 김중섭 전승교육자: 이진호, 인남순 |
| Type of UNESCO List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 Incribed year in UNESCO List | 2009 |
Information source
Materials related to
Article
-
DI00001083
섣달그믐의 춤, 처용무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음력 1월 1일의 전날인 섣달그믐1.이 되면 민간과 궁중에서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나례(儺禮)를 행하였다. 나례란 묵은해의 잡귀를 몰아내고 평온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로 민간과 궁중에서 이뤄졌다. 민간에서는 집안의 잡귀들이 놀라 달아나도록 마디가 있는 청죽(靑竹)을 불에 태워 큰 폭음을 내었다. 조선 시대 궁중에서도 나례로 탈을 쓰고 제금(提金)과 북을 울리며 궁을 돌아다녔는데, 이날에는 궁중무 중 유일하게 인간의 형상을 한 탈을 쓰고 추는 춤을 추었다. 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처용무(處容舞)이다. 처용무는 처용설화를 기반으로 한다. 처용과 관련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처용은 통일신라 헌강왕 때의 인물이다. 처용이 집을 비운 사이 처용의 처와 몰래 동침한 역신을 처용이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고, 이러한 처용의 태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역신은 그의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로 맹세했다. 이후 민가에서는 처용의 형상을 대문에 붙여 역신을 몰아내고자 하였고, 처용은 벽사진경(辟邪進慶)2.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사연으로 처용무는 궁중 나례에서 빠지지 않은 춤이었다. 현행 처용무는 조선 시대 때 갖추어진 것으로 5명의 남성 무용수들을 통해 연행된다. 무용수들은 청·백·적·흑·황 오방색 옷을 입고 팥죽색 피부에 주석 귀고리·모란·복숭아 열매 등으로 장식된 처용탈을 쓰는데, 탈의 장식 요소들은 벽사와 진경을 상징한다. 처용무는 앞서 언급한 통일신라 헌강왕 시기에 발생 연원을 두고 전해져 오고 있으며 역사적 시원(始原)이 긴 만큼 풍부한 예술성과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이를 인정받아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처용무는 약 1,100년 동안 민간과 궁중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춤·글·구전 등의 형식을 통해 다채롭게 확산하며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오늘날 처용은 창작무용·애니메이션·드라마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로 재창작되며 생동하는 ‘유산’으로도 향유되고 있는데, 처용이 가진 긴 생명력과 상징성은 주목할 만하다. 그 이유는 엄격한 내용과 형식을 지니며 소수를 위한 예술이었던 궁중무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매체 및 양식과 결합하고 있는 민속무와 대비되듯이 소극적으로 재현되며 대중들에게 더디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기 전 자연재해나 질병에 대해 취약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신년의 질병과 액운을 막고자 처용무와 같은 액막이 행사를 했다.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국가와 마을 단위로 액막이 의식을 지내지 않지만, 현대인들은 동짓날 팥죽을 먹거나 보신각 타종과 같은 송구영신(送舊迎新)3.의 통과의례(通過儀禮)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섣달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시기이다. 과거와 현대의 생활방식이 바뀌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형태와 방식은 다르더라도 한해를 잘 마무리하며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세기를 관통하는 바람일 것이다. 이러한 바람들이 모여 21세기의 처용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보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Notes 1. ⇑ 그믐은 음력으로 달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며, 섣달은 음력 12월을 의미한다. 따라서 섣달그믐은 음력 12월의 마지막 날을 가리킨다. 2. ⇑ 요사스러운 귀신을 쫓고 경사로운 일을 맞이함. 3. ⇑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사진 : 처용무 © 김태욱
황도희 2022 -
DI00000145
처용무 : 자연의 순환으로 복을 부르는 춤
처용무는 다섯 사람이 다섯 가지 색깔의 옷을 각자 입고서 큰 가면을 쓰고 추는 한국의 전통 춤이다. 처용무의 다섯 가지 색깔 옷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의 겉옷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색은 처용무라는 춤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다섯 가지 색상의 옷은 한국의 오랜 전통 사상인 오행(五行)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옷을 모두 착용한 처용무 무용수는 마지막으로 처용가면을 착용한다. 이제 처용무를 춤출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종숙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청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