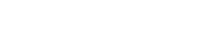-
Manage No, Sortation, Country, Writer ,Date, Copyright Manage No EE00000174 Country Republic of Korea ICH Domain Social practices, rituals, festive events Knowledge and practices about nature and the universe Address 제주도의 해안 마을 대부분과 그 부속 도서에 해녀들이 살고 있기에 제주 해녀 문화는 제주도 전역에 퍼져 있다. 물속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은 한반도의 연안 마을과 일부 다른 섬에서도 행해지고 있긴 하지만 제주도에 가장 많은 해녀가 있다. 또한, 제주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물질은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른 이주 노동자가 행하는 것으로 제주도 밖에서 물질을 했던 제주 해녀가 전수하여 준 것이다. 한국의 다른 지역에는 제주도를 떠나 그 곳에 정착한 제주해녀와 그 지방의 해녀가 있다. 남녀가 물질을 하는 경우는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Year of Designation 2017.0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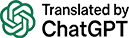
| Description | [제주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제주도는 한반도 남해 바다의 화산섬으로 인구 약 60만 명이 살고 있다. 제주도의 일부 지형은 2007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제주 해녀들은 보통 잠수를 할 때마다 1분 정도 숨을 참고 수심 10m 아래 바다로 내려가 해산물을 채취한다. 잠수를 마치고 수면에 떠올라 숨을 내뱉을 때는 매우 특이한 소리를 내는데 이를 ‘숨비소리’라고 한다. 해녀는 여름철에는 하루 6~7시간, 겨울철에는 하루 4~5시간, 연간 90일 정도 작업한다. 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얻은 소득은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제주 해녀들은 바다 속의 암초와 해산물의 서식처를 포함하여 바다에 관한 인지적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조류와 바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다. 이러한 머릿속 지도와 지식은 저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된 물질을 통해 경험으로 습득된다. 해녀들은 물질을 할 수 있는 날씨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인 일기예보보다 물질 경력이 오래된 상군 해녀의 말을 듣고 판단한다. 제주 해녀들은 바다의 여신인 용왕할머니에게 제사(잠수굿)를 지내 바다에서 안전과 풍어를 기원한다. 잠수굿을 지낼 때는 해녀들이 ‘서우젯소리’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물질을 할 바다로 나갈 때 불렀던 ‘해녀 노래’ 역시 제주 해녀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
|---|---|
|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 제주도 주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족 중에 해녀가 있기 마련이므로 제주 해녀 문화는 제주도민의 정체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작은 부표(테왁) 하나에 의지하여 거친 바다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해녀의 이미지는 제주도민의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런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 정부는 해녀를 제주도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지정하였고 ‘해녀노래’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가장 즐기는 노래가 되었다. 제주도는 토양이 비옥하지 않은 화산섬이기 때문에 대규모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한때 제주 해녀들은 각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한편, 특별히 지정된 일부 바다에서 공동 작업을 해서 얻은 이익으로 공동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학교 바당’이라 불리는 구역에서 얻은 모든 소득은 공동체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를 짓는 데 사용되었다. 이런 활동은 해녀와 그 공동체가 가진 연대와 조화의 정신을 증명한다. 환경 친화적인 채취 활동에 해당하므로 제주 해녀들의 물질 작업은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더 많은 해산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적인 욕심이지만 호흡을 돕는 장비의 도움 없이 물속에서 머무는 개인 능력의 한계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하는 자제가 가능하다. 공동체 전체가 해마다 잠수 일 수를 결정하고 작업 시간,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의 최소 크기를 정하며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 해녀 문화는 자연에 순응하며 삶을 일구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 Transmission method | 제주 해녀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물질에 적합한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반복된 물질과 훈련을 통해서 강하고 능숙한 해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과거 제주도 해안 마을의 소녀들은 ‘애기바당’이라고 부르는 얕은 바다에서 물질을 배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해녀의 삶이 더 이상 모든 소녀들이 따라야 할 자연스러운 삶이 아닌 것이 되면서 해녀라는 직업은 고민스런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각 마을의 제주 해녀 공동체는 새로운 해녀들을 위한 직업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한 마을의 어촌계가 설립한 해녀학교는 보다 체계적으로 물질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한 제주 해녀가 강조했듯이 물질 작업은 ‘눈치껏 배우는’ 것이다. 여러 형태의 사냥이나 어로 작업이 흔히 그러하듯이 물질의 경우도 해녀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 있다. 해녀들이 불을 피워 몸을 덥히는 해안가의 불 턱에서, 또는 해녀들을 위한 현대적인 휴게 시설에서 신참내기 해녀들은 다른 해녀들, 특히 상군 해녀들의 경험을 귀담아들음으로써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동기와 책임감을 배운다. 이렇게 물질 기술을 포함한 제주 해녀 문화는 제주 해녀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으며, 각급 학교와 해녀박물관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
| Community | 해녀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조개, 성게, 전복 그리고 우뭇가사리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며 약 4,500명의 해녀들이 제주도에 있다. 마을 어촌계는 마을 주변 어장에 대한 입어권(入漁權)을 독점하는데 제주도에는 100개의 어촌계가 있다. 마을 어촌계와 관련있는 해녀회는 해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해녀회와 어촌계 외에도 2011년 제주도 조례에 따라 제주해녀문화수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물질하는 사람을 해녀(海女)라고 부르는데, 제주도의 몇몇 마을에서는 잠녀(潛女) 혹은 잠수라고도 부른다. 물질은 노련한 해녀들을 관찰하고, 다른 해녀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배운다. 또한 반복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익힌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족 내의 여성들 사이에 전승된다. 물질 기술과 제주 해녀 문화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주 해녀 공동체에서 오랜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왔다. 물질 실력을 기준으로 제주 해녀공동체는 상군, 중군, 하군의 세 집단으로 나뉜다. 상군 해녀는 오랜 기간 물질을 하여 기량이 뛰어나며, 암초와 해산물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어 흔히 해녀회를 이끈다. 제주 해녀들은 상군 해녀들로부터 물질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해녀 문화에 대한 지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배운다. 마을 어촌계가 마을 주변 어장에 대한 입어권(入漁權)을 독점하기 때문에 물질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촌계에 가입하고 해녀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촌계와 해녀회는 제주 해녀 문화를 실천하고 전승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진다. |
| Type of UNESCO List |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 Incribed year in UNESCO List | 2016 |
Information source
Materials related to
Photos
Article
더보기-
DI00000571
제주 해녀의 숨비소리길, 삶, 신앙
“숨비소리는 고통의 소리이자 생명의 소리입니다.” 평생을 해녀로 살았던,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제주 토박이인 김윤복씨가 한 이야기다. ‘호오이 호오이~’. 숨비소리는 깊게는 수심 20미터까지 해녀들이 물질을 하며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소리다. 김씨는 어린 시절 물질과 밭일로 바빴던 어머니를 위해 새벽 도시락 배달을 하러 불턱을 찾곤 했다고 한다. 불턱은 해녀들이 물질을 하러 옷을 갈아입거나 물질이 끝난 후 불을 피워 몸을 녹이며 정보를 교환하고 가정 대소사를 나누던 곳으로,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 만든 작은 생활문화 공간이다. 그곳에서 어린 김씨는 어머니가 구워준 미역귀를 아주 달게 먹었다고 한다. “새벽 일찍 불턱으로 가는 길이 그때는 그렇게 귀찮았는데, 지금은 한 없이 그리워집니다.” 지난 5월 25일 제주해녀박물관이 기획한 ‘해녀를 따라 걷다’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푸르고 투명한 너른 바다, 청명한 하늘이 제주를 걷는 발걸음을 더욱 경쾌하게 했다. 필자를 비롯한 참가자 20여명은 제주에서 해녀 수가 280명으로 가장 많다는 세화리의 트레킹 코스인 ‘숨비소리길’을 김씨를 따라 한 시간 반 가량 걸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한창 자란 우뭇가사리와 이를 캐서 땅 위에 말리고 있는 모습, 해녀와 어부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바닷가에 지어진 신당, 땅 속으로 스며든 빗물이 해안가에 솟아올라 마을 식수원이 되는 ‘용천수’, 화산활동으로 지천에 깔린 현무암 돌을 쌓아 밭의 경계를 만든 밭담, 그리고 불턱을 만났다. '숨비소리길’은 해녀의 삶을 오롯이 보여주는 길이었다. 해녀들은 5월까지 우뭇가사리, 미역을 비롯해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다가도, 6월부터는 산란철을 맞은 소라나 전복 등을 캐지 않는 금채기에 들어간다. 그렇다고 해녀들이 일손을 놓는 일은 극히 드물다. 물질뿐 아니라, 밭일까지 도맡은 해녀들은 8월까지 금채기 동안 당근, 감자, 무 등을 파종하고 겨울부터 봄까지 수확한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신당이 75곳, 불턱이 35곳 남아 있다. 1700년대에는 당 500곳과 절 500곳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해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그 수(현재 4300명)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해녀 삶의 터전인 바다도 예전 같지 않다. 육지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바다 환경의 변화를 제주 토박이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다. 김씨는 “1940~50년대만 해도 바닷가에서 소라와 물고기를 만나는 일은 아주 흔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백 년 역사를 지닌 제주 해녀문화는 독특한 공동체적 생활방식과 생태주의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이후 해녀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나 프로그램들도 늘어나고 있다. 해녀들은 일터이자 삶터인 바다 생태를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서 무사히 물질 할 수 있도록 소원하며, 끈끈한 연대를 형성해 왔다. 이런 해녀 문화를 보호하고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주에는 해녀의 조업활동, 생활모습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어온 무속신앙을 엿볼 수 있는 사진전과 예술전시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사진 1 : 제주 산지천갤러리에서 전시된 해녀 잠수굿 관련 고(故) 김수남 작가의 사진들 ⓒ 오진희 사진 2 : 제주 세화리 해변의 불턱 ⓒ 오진희
오진희 2019 -
DI00000060
해녀들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해녀(海女)는 제주여성의 상징적 존재며, 그들의 잠수작업은 제주 전통 생업으로서 대표성을 띤다. 해양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녀는 잠수기술을 익히고 조수를 이용하는 등 생태에 대한 지식체계를 전승시켰으며, 물옷과 도구제작, 해녀노래와 무속의례 등 독특한 해녀문화를 창조했다. 한편 해녀문화는 여성으로서 기계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캐는 잠수 기술과 작업 경험에서 축적된 민속지식, 생업에서 파생된 문화현상에 관한 것들이다.
좌혜경 전 연구원, 해녀박물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