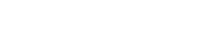-
Manage No DI00000607 Country Republic of Korea Author 강소전,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Published Year 2021 Language Korean Copyright 
Attach File View (K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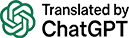
| Description | 제주도의 영등굿은 음력 2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과정에서 벌이는 굿이다. 영등신은 보통 ‘영등할망’으로 불리며, 겨울에 북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찾아와 땅과 바다에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영등신이 들어올 때 영등환영제를 지내고, 보름 뒤 영등신이 나갈 때에 맞춰 영등송별제를 지낸다. 현재 전승되는 양상을 보면 영등환영제에 견주어 영등송별제를 더 비중 있게 치르는 편이다. 제주도 내에서 대개 음력 2월 12일경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기간 동안에 영등굿이 집중되어 있다. | ||
|---|---|---|---|
Information source
Elements related to
Materials related to
Article
-
DI00001188
바람의 여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전통사회에서 제주는 한반도와 남해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화산섬이라는 자연적인 특징을 토대로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매년 음력 2월, 제주 전역에서는 바다의 평온과 풍작,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한국의 세시풍속 중 하나인 ‘굿’을 지낸다. 해녀들과 선주들은 신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무당들은 신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바람의 여신(영등신), 용왕, 산신 등 자연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낸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바다가 옛 섬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담아내는 제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마을의 여러 수호신과 바다의 용왕, 선조와 더불어 바람의 여신, 영등신(영등할망) 신화를 기반으로 한다. 영등신은 제주에서 신화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외방신으로 음력 2월 초하룻날에 돌아와 제주에 머무는 동안 날씨를 관장하고, 떠날 때에는 땅에는 다음 해에 수확할 곡식의 씨를, 바다에는 해초와 해산물의 씨를 뿌린다고 전해진다. 영등신은 바다를 휘저어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바닷물을 순환시켜 해조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풍요의 신이기도 하다. 이 신화는 삶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공간이기도 한 바다에 대한 섬 주민들의 인식을 잘 반영한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동국세시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등굿이 오랫동안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이 유산의 진정한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삶의 일부인 바다에서 얻은 해양 자원으로 제사에 쓰일 음식을 마련하며 해녀들과 선주들은 굿을 이끄는 무당과 함께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주관하는 하나의 주체로 전통을 계승하였다. 오랜 시간 제주도 주민들의 삶 속에서 전래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1980년 안사인 심방이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으며 더 많은 사람에게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게 되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산신을 모시는 제사와 영등을 모시는 제사가 ‘영등굿’이라는 하나의 무속 제례로 결합한 제주도만의 전통이다. 매년 음력 2월 1일이 되면 영등굿이 치러지는 마을의 칠머리당에서는 영등환영제로 영등신을 맞이한다. 마을 주민들은 영등신, 마을의 수호신, 용왕에게 제사를 드리며 풍요로운 한 해와 마을의 안녕을 기리고, 2월 14일, 영등송별제를 지내 여러 신을 무사히 돌려보내며 제례를 마무리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제주 사람들의 자연관과 민속신앙의 소산으로 전승되어온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독특한 해녀 신앙과 민속신앙의 결합을 보이는 국내 유일의 해녀 굿으로 학술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현대화로 민속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발달하는 가운데에도, 제주도 사람들에게 “칠머리당 영등굿”은 매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연의 흐름과 함께했던 선조들의 삶을 잘 담아낸 의례이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체감과 유대감을 길러주는 중요한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제주도의 선조들은 이런 바람을 단순히 두려워하고 극복해야 할 존재가 아닌 풍부한 자원이라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제주 사람들의 자연관은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 되리라 생각한다. 사진 :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문화재정보
박민경 2022 -
DI00000479
[제12차정부간위원회 특집] 자연의 섬 ‘제주’와 ‘제주인’의 지혜
제주도를 처음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있다. 바로 검은 돌이다. 제주는 화산섬으로 온통 돌투성이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내뿜은 화산탄들이 흩어져 제주의 모든 땅들을 뒤덮고 있다. 지금도 밭에 가면 흔하게 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하지만 13세기부터 제주 사람들은 밭에 흩어진 쓸모없는 돌들을 모아 밭의 경계에 돌담을 두르고 경작지를 확보하였다. 현재 그 길이가 22,100Km에 이른다. 이 돌들은 얼기설기 쌓여 있어 대충 쌓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제주인의 지혜가 숨어있다. 그 열쇠는 바로 바람이다. 제주는 여름에 불어오는 태풍은 물론이고 4계절 내내 강한 바람이 분다. 빈틈 없이 촘촘히 돌담을 쌓는다면 제주 사람들은 매일 들에 나가 넘어진 돌을 다시 쌓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구멍이 난 울퉁불퉁한 제주의 돌담은 바람의 힘을 떨어뜨리고 통과시킨다. 삶에서 얻은 지혜이다. 제주의 옛 이름은 ‘탐라’이다. 탐라의 시작과 관련된 이야기로는 땅에서 솟아난 세 신인(神人)이 탐라를 건국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이곳은 성스럽게 여겨져 ‘삼성혈’이라 불린다. 이는 한국 본토의 고대 건국신화가 하늘에서 알로 태어난 것과는 달리 땅에서 솟아난 것으로 문화적 원형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도에는 1만8천의 신이 있다. 제주도민들은 세상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제주의 거친 자연환경에서 비롯된다. 쉴 새 없이 불어오는 거친 바람과 물이 고이지 않는 척박한 화산 땅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다. 그래도 살아야 했던 제주도민들은 거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살기 위해 신을 찾았던 것이다. 제주의 마을에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들의 거처인 ‘본향당’들이 있다. 이곳엔 ‘심방’이라 불리는 무당이 있다. 이들은 제주민들을 신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해녀들과 어부들을 위해 음력 2월 영등굿이 진행된다. 영등신은 바람의 신으로 파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해녀들과 어부들에겐 바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신이다.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제주도에서는 이 기간 동안 30여 곳에서 바다의 신을 위한 의례를 펼친다. 제주에는 여신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여신과 달리 남신들에게 기대거나 속박되지 않는다. 거대한 거인으로 치마폭에 흙을 날라 제주 섬을 만들었다는 ‘설문대할망’, 생명을 잉태시키는 ‘삼승할망’, 농업을 관장하는 ‘자청비’ 등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제주여성들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유교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남자 중심의 사회와는 달리 제주도의 여성들은 자존감이 매우 높다. 경제활동도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주해녀이다. 작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는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여성 중심의 사회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화산섬으로 물이 고이지 않아 벼농사를 짓지 못하는 제주도에서 땅이 아닌 바다에서 먹을거리를 찾아야 했던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해녀가 되었으며 혼자가 아닌 다 같이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 제주의 자연은 척박하며 사람이 살아가기엔 모자란 땅이다. 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이를 이용하여 살아왔다. 그 곳엔 1만8천의 신들이 있고 이웃이 있다. 이것이 제주문화를 지금까지 이어온 힘이다. 사진 : Jeju haenyeo (female divers) crossing low stone walls to get to the sea © Jeju Haenyeo Museum
강권용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