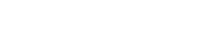-
Manage No VC00000053 Country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Year 2020 Copyright ICHCAP, Kosra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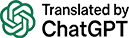
| Description | 오늘날 우리는 손끝의 작은 움직임 하나로 과거의 시간과 기억이 한눈에 펼쳐지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달이 불러온 기록 매체의 급격한 변화는 이전 시대의 귀중한 기록 자료들을 효용가치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무형유산 관련 기록 자료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오래된 많은 아날로그 자료들이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훼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이같은 무형유산 관련 아날로그 시청각 자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디지털화 복원과 관리, 활용, 관련 정보보급에까지 이르는 디지털화 지원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센터는 2011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아태지역 디지털화 시청각자료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2020년에는 미크로네시아 연방 코스라에 역사보존국과 협업하여 미크로네시아의 무형유산을 디지털화하였다. | ||
|---|---|---|---|
Information source
Materials related to
Videos
-
VI00000213
미크로네시아 코스라에 무형유산: 토속음식 요리
토속음식 요리란 일용할 양식을 수확하는 과정 및 음식 조리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예: 파파용 도구)를 가리키며, 음식 준비는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파파(fafa) 준비는 다양한 특별행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손이 청결한 남자들만 파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파파를 준비하는 남자는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파파 요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라놈터(sranomtuh, 코코넛밀크와 섞은 사탕수수를 곁들인 으깬 파파)라고도 하는 파파 피티(fiti, 구운 코코넛 스윗 소스를 곁들인 으깬 타로 볼), 에래(erah, 으깬 부드러운 타로와 바나나 주위로 코코넛 크림의 지방이 굳어 얇은 막을 형성한 요리), 스로노 쿠타크(srono kutak, ‘스로노’는 조각이나 부분, ‘쿠타크’는 부드러운 타로, ‘패스루크(pahsruk)’는 단단한 타로를 뜻한다. 물이 필요 없고 단순히 섞는 게 아니라 힘든 파파 작업이 필요한 종류의 파파로, 으깨기 힘들고 상당히 끈적거린다), 수클레(suklac, 바나나와 타로로 만든 파파로 자주색을 띰), 파파 응운(ngun, 마치 유령같이 반투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도 부르는 파파 스피릿(fafa spirit), 파파 포트(fafa pot), 리카스링스링(likasringsring)이 있다(Sarfert 참조). 몇몇 음식은 태음력에 따라 준비한다. 가령 작물을 심고 수확하기에는 보름달이 뜬 때가 적기이다. 이 시기에 토양의 질감이 최상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름달이 뜬 첫 사흘이 가장 적합할 때도 있다. 야간의 횃불 낚시나 몰로크(molok, 식용 동물) 사냥도 만월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10:25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2020 -
VI00000216
미크로네시아 코스라에 무형유산: 직조와 전통가옥
코스라에 문화에서 조각은 무쿨(mukul, 남자)의 일이다. 남자들은 토크 요트(tok yot, 파파(타로 잎)용 돌 절굿공이), 토크 사크(tok sak, 아인파트(ainpat)라는 요리의 재료인 타로와 바나나를 찧는 데 쓰이는 나무 절굿공이), 태(tah, 빵나무 열매를 자를 때 쓰는 도끼), 퍼파크(fuhfak, 장작 팰 때 쓰는 도끼의 나무손잡이), 오아크(oak, 카누), 터프 인 파파(tuhp in fafa, 파파를 담아내는 배 모양의 나무 쟁반), 므웨 애르얘르(mwe ahryahr, 길거나 짧거나 납작한 것 등 다양한 모양의 나무 스푼) 등 여러 용품을 조각한다. 그 밖에도 조각이 필요한 것으로 라크라크(laklak, 카누의 현외장치)나 장난감과 목공예품이 있다. 카누와 더불어 노도 조각해서 만든다. 코스라에에는 여러 유형의 직조가 있고 직조로 만들 수 있는 물품도 다양하다. 그 예로는 돗자리(키아카 오톼트, kiaka otwot), 부채(팔, pal), 바구니(포토, fotoh), 코코넛 잎을 엮어 만든 지붕마루에 덮는 이엉(스래오, sraho), 패서(fahsuh, 니파야자만을 이용해 엮은 지붕 이엉) 등이 있다. 코스라에의 날줄 무늬 짜기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직조 문화 중에서도 독특한 것으로 간주된다. 직조에 해당하는 코스라에어 단어는 만드는 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화폐로 사용되거나 가족의 유대관계 및 기타 관계나 명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 다양한 직조품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아이가 장차 직조를 하게 한다는 뜻에서 다같이 성가를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코스라에에서도, 장례식용 음식 바구니 준비, 석호에서 물고기를 잡는 여성의 허리춤에 차는 낚시 바구니, 베틀로 허리띠 짜기(톨, tol), 지붕 이엉, 모자, 밧줄 등에서 직조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 준비에서 중요하다고 알려진 바구니의 종류로 최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파파를 보관할 때 쓰는 별 모양 바구니인 푸사니에(fusanie), 둘째는 푸사니에의 큰 형태로 어린 코코넛 잎으로 엮어 만드는 우사니에 카피엘(usanie kapiel) 또는 푸사니에 사 누(fusanie sa nu), 셋째는 코코넛 잎으로 만든 손잡이가 달려 있고 직조 접시에서 이름을 따서 부르는 바구니인 쿠움팔(kuumpäl)이다. 직조는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과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가령 특정 종류의 노끈을 노수나프 신(나스룬시아프 또는 나주엔지아프라고도 함)의 이름을 따서 노수나프(nosunap)라고 부를 수 있다. 코스라에가 한때 납작한 노끈의 최대 소비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상당한 이동을 시사한다. 이는 코스라에인들을 사타왈과 풀루와트까지 연결한, 최근에 수집된 구전역사와도 일치한다. 널리 쓰이는 직조재료 중에서도 바나나 섬유, 히비스커스, 판다누스가 가장 두드러진다. 각 재료의 준비는 직조할 물품에 따라 달라진다. 바나나 섬유가 가장 많이 쓰일지는 몰라도 히비스커스 섬유가 염색이 더 쉽다. 직조재료 가닥용 염료는 지엽, 특정 종류의 진흙, 맹그로브 꽃받침(검정색), 강황(노란색), 바나나 흡지(푸른색), 노니(붉은색) 등에서 추출된다. 이러한 여러 색 중에서도 붉은색이 가장 귀하다. 직조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은 식물 종류에 따라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히비스커스 섬유는 바닷물에 며칠간 담가놓아야 하는 반면, 바나나 섬유는 햇볕에 말린 뒤 각각의 섬유를 더 얇은 가닥으로 나눈다. 직조는 쓰임새가 다양하므로 오늘날 코스라에의 노인들은 꾸준히 직조를 행하고 있다. 코스라에 방식으로 지을 수 있는 가옥에는 인 움(in um, 취사장), 이문 오아크(imun oak, 카누 가옥), 이웬 몽레(iwen monglac, 지역 숙박시설)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지역 가옥을 짓는 일은 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항상 지역 공동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상대적으로 힘든 일은 무쿨(mukul, 남자)이 맡고, 머텐(muhtacn, 여자)은 지붕을 일 이엉을 엮는다. 무쿨은 숲에 가서 건축 재료를 구해오는데, 가옥 유형별 필요한 목재의 종류에 따라 맹그로브를 채취하기도 한다. 집 짓는 데 필요한 목재의 규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며, 이 다섯 가지 크기의 목재가 가옥의 열 가지 구성부품에 쓰인다. 우선 가장 크고 무거운 부품은 스루(sru, 기둥)이다. 스루를 나를 때는 노동요를 부르기도 하는데,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거나 끌어당기는 동력이 되어준다. 그 다음으로 큰 부품은 켈레프(kaclacp), 랄라(lala), 올(ohl)이다. 켈레프와 랄라가 올을 지탱하고, 올이 가옥의 높이를 결정한다. 세 번째 크기의 목재는 포쿼스르(pokwuhsr, 트러스)를 만드는 데 쓰인다. 이보다 한 단계 작은 목재는 새크패스르(sahkpahsr, 서까래)와 폴로(folo, 들보)에 쓰인다. 가장 작은 목재는 이엉 지붕을 일 때만 쓰이는 퀘스리크(kwesrihk, 이엉을 붙일 수 있는 지점)와 이엉을 밑에서 받치기 위해 놓는 수쿠눔(sukunum)에 적용한다. 나무를 베는 일도, 벤 통나무를 사용하기 위해 섬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도 코스라에 태음력에 맞춰서 진행된다. 파크사크(paksak, 직역하면 물체 띄우기)란 강이나 수로를 통해 통나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에 적합한 때를 의미한다. 그 시간대는 조수에 좌우된다. 이러한 관습이 있었던 이유는 특정 시간 동안에는 수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스라에인들은 큰 통나무를 베고 노동요에 힘입어 해안가로 가져간 뒤 파크사크 동안에 새로운 장소로 옮겼다.
24:00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2020 -
VI00000214
미크로네시아 코스라에 무형유산: 전통 항해술, 카누 제작 및 경주
먼 옛날 캐롤라인제도의 일부 섬에서는 카차우(Kachau)가 코스라에를 의미했고, 때로는 동쪽 방향을 뜻하기도 했다. 이 의미는 현재까지도 캐롤라인제도 전역에 그대로 남아 있다. 오늘날 중부 캐롤라인 산호도의 섬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흔적을 코스라에에서 찾는다. 코스라에인들은 마셜제도는 물론 서쪽으로는 최대 사타왈(Satawal)까지 항해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항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그들은 삶의 다방면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보유해야 했다. 항로를 정할 때는 달과 별을 참조했다. 카누 건조자를 가리키는 표현은 므웨트 오레크 오아크(mwet orek oak, 두 형태소 중 ‘오레크’는 작업을, ‘오아크’는 카누를 뜻한다)이다. 이전 시대에 그들은 장인 계층으로서 가족 간에 기술을 전수했으며, 각자가 자기 소유의 카누를 만들었다. 코스라에에서 카누 건조 초창기에는 아세트(asset, 카누의 측면을 붙이기 위한 천연 뱃밥이나 접착제로 쓸 수 있는 나무종)를 구멍을 막는 용도로 사용했으며, 모스(mos, 빵나무 열매) 수액은 나무조각을 붙이는 접착제로 썼다. 이때 모스 수액에는 카누를 조각하면서 나온 나무 부스러기를 섞어서 사용했다. 또한 라프(lap)라 불리는 적색토를 아세트와 섞어 카누에 칠을 하는 데 사용했다. 코스라에섬 곳곳에 적색토가 있지만 카누에 쓰이는 라프는 우퉤(Utwe)에서만 난다. 벌채목 몸통을 끌어당길 때는 대개 특별한 노동요를 불렀다. 이러한 노동요는 지금도 코스라에에 남아 있으며 특히 중노동을 할 때 불린다. 카누 건조가 끝나면 므웨트 셀러(mwet seluh)와 그를 보조한 일꾼들을 위한 특별한 잔치가 열린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송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암초지대 밖에서는 카누 이용 빈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카누는 대중적인 인기 스포츠인 카누 시합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라에인들에게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 있다. 카누 시합은 일본의 위임통치로부터 해방된 후에 시작되어, 오늘날에는 해방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되었다.
22:07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2020